주제의 확장 ―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주제의 확장 ―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상(常)한가 무상(無常)한가?’의 시작해 여실지견(如實知見)에 이르는 문답으로 구성된 가르침을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좀 더 연구한 필요한 주제입니다마는 이런 접근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SN 22.82-보름달 경)은
“ṭhānaṃ kho panetaṃ, bhikkhave, vijjati yaṃ idhekacco moghapuriso avidvā avijjāgato taṇhādhipateyyena cetasā satthusāsanaṃ atidhāvitabbaṃ maññeyya. iti kira, bho, rūpaṃ anattā, vedanā... saññā... saṅkhārā... viññāṇaṃ anattā. anattakatāni kammāni kathamattānaṃ phusissantīti? paṭipucchāvinītā kho me tumhe, bhikkhave, tatra tatra tesu tesu dhammesu
“비구들이여, 알지 못하고 무명(無明)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갈애에 지배되어 심(心)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참으로, 색(色)은 무아(無我)다. 수(受)는 … 상(想)은 … 행(行)들은 … 식(識)은 무아다. 무아(無我)에 의해 지어진 업(業)들은 어떤 아(我)에게 닿을 것인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여기저기서 거듭 그 법들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나의 가르침이 있다.
라고 하는데,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으로
“taṃ kiṃ maññatha, bhikkhave, rūpaṃ niccaṃ vā aniccaṃ vā”ti? “aniccaṃ, bhante” … nāparaṃ itthattāyāti pajānātī”ti.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色)은 상(常)한가 무상(無常)한가?” … 다음에는 현재 상태[유(有)]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를 제시합니다. (SN 22.59-무아상 경)을 비롯한 많은 경에서 오온(五蘊)에 대한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이끈 뒤 이어서 해탈지견(解脫知見)으로 삶이 완성을 이끄는 정형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MN 109-보름달 큰 경)에서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여기저기서 거듭 그 법들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나의 가르침이 있다.’ 부분이 ‘paṭivinītā kho me tumhe, bhikkhave, tatra tatra dhammesu’로 나타나는데, ‘paṭivinīta [pp. of paṭivineti] removed, dispelled, subdued’여서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으로 읽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MN146-난다까의 가르침 경)에서 난다까 존자는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할 때 ‘paṭipucchakathā kho, bhaginiyo, bhavissati 자매들이여, 질문을 받으며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모르거나 불확실하거나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고 되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오온(五蘊) 대신 육내입처(六內入處)-육외입처-육식(六識)에 대해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관점을 확인한 뒤 수(受) 또한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비유로써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은 직접적으로는 오온이나 십이처의 무상으로 시작해서 여실지견까지 이끄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paṭipucchāvinītā는 (AN 2.43-52-집단 품) 48.에서 되물음에 의한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질문 없이 교육받고 되물음(*) 없이 교육받은 집단은
(*) ‘idaṃ, bhante, kathaṃ; imassa kvattho’”ti/‘idaṃ, bhante, kathaṃ, imassa ko attho’’ti
여래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空)에 연결된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듣지 않을 것이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무위(無爲)의 앎을 가진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이 지은 것이고 아름다운 문자와 표현을 가진 시이고 외도의 제자들에 의해 말해진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최고의 앎을 가진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법을 숙련한 뒤에 서로서로 되묻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는다. — ‘어떻게 이러하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그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법들에 대해 의심을 제거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되고, 되물음에 의해 교육받고 질문 없이 교육받지 않은 집단은
시인이 지은 것이고 아름다운 문자와 표현을 가진 시이고 외도의 제자들에 의해 말해진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듣지 않을 것이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무위(無爲)의 앎을 가진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래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空)에 연결된 그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들을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최고의 앎을 가진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법을 숙련한 뒤에 서로서로 되묻고 되돌아본다. — ‘어떻게 이러하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그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법들에 대해 의심을 제거한다.
라고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되물음에 의해 교육받는다는 것이 단지 문답의 형식을 가진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래의 가르침에 대해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의심을 제거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ṭipucchāvinītā(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은 특정한 내용을 지시할 때는 오온(五蘊) 또는 십이처(十二處)에 대한 무상(無常)의 관찰로 시작하여 여실지견(如實知見)과 해탈지견(解脫知見)에 이르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설법인 것으로 이해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 paripucchati paripañhati — ‘idaṃ, bhante, kathaṃ; imassa kvattho’’ti?
paripucchati paripañhati — ‘idaṃ, bhante, kathaṃ? imassa ko attho’’ti?
paṭipucchanti na ca paṭivicaranti — ‘idaṃ kathaṃ, imassa ko attho’’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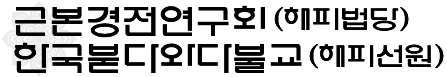

 서적출판
서적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