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의 용례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의 용례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이라고 번역하였는데, 활성화된 지금 삶의 나열이고,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됩니다.
• 안(眼)-색(色)을 연(緣)하여 본 것(diṭṭhaṃ), 이(耳)-성(聲)을 연하여 들은 것(sutaṃ), 의(意)-법(法)을 연하여 인식한 것(viññātaṃ) 그리고 나머지[비(鼻)-향(香), 설(舌)-미(味), 신(身)-촉(觸)]를 연한 것으로의 닿아 안 것(mutaṃ) → (출산 된) 식(識)
• 1차 인식의 과정에서 안 뒤에[식(識)] 경험하는 것으로의 수(受) = 얻은 것(pattaṃ)
•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수(受)를 무명(無明-항상한 것이라고 잘못 조사)과 탐(貪-항상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조사), 진(嗔-항상하기 때문에 나쁜 혹은 싫은 것이라는 조사) = 조사한 것(pariyesitaṃ)
이 용례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두 가지 형태입니다.
①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②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pariyesitaṃ anucaritaṃ manasā
이때, ②의 형태는 (MN 143-아나타삔디까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용례는 모두 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1] ②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pariyesitaṃ anucaritaṃ manasā의 용례 ― (MN 143-아나타삔디까를 위한 가르침 경)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5_15_01&wr_id=1
• tasmātiha te, gahapati, evaṃ sikkhitabbaṃ — ‘yampi me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pariyesitaṃ anucaritaṃ manasā tampi na upādiyissāmi, na ca me taṃnissitaṃ viññāṇaṃ bhavissatī’ti. evañhi te, gahapati, sikkhitabban”ti.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 ‘나는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이어서 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그것을 의지한 식(識)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2] ①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의 용례
1. “yaṃ, bhikkhave, sadevakassa lokassa samārakassa sabrahmakassa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
1) (DN 29-정신 경) ― 그래서 여래라고 불린다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4_03_06&wr_id=14
yañca kho, cunda, sadevakassa lokassa samārakassa sabrahmakassa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sabbaṃ tathāgatena abhisambuddhaṃ, tasmā ‘tathāgato’ti vuccati.
쭌다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모든 것을 여래는 깨달았다. 그래서 여래라고 불린다.
2) (AN 4.23-세상 경) ― 그래서 여래라고 불린다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8_07_03&wr_id=1
“yaṃ, bhikkhave, sadevakassa lokassa samārakassa sabrahmakassa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sabbaṃ taṃ tathāgatena abhisambuddhaṃ. tasmā ‘tathāgato’ti vuccati.
비구들이여, 여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닿아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意)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여래(如來)라고 불린다.
3) (AN 4.24-깔라까라마 경)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8_07_03&wr_id=9
“yaṃ, bhikkhave, sadevakassa lokassa samārakassa sabrahmakassa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mahaṃ jānāmi.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안다.
“yaṃ, bhikkhave, sadevakassa lokassa samārakassa sabrahmakassa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mahaṃ abbhaññāsiṃ. taṃ tathāgatassa viditaṃ, taṃ tathāgato na upaṭṭhāsi.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 나는 그것을 실답게 알았다. 그것은 여래에게 알려졌다. 여래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yaṃ, bhikkhave, sadevakassa lokassa samārakassa sabrahmakassa sassamaṇabrāhmaṇiyā pajāya sadevamanussāya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mahaṃ na jānāmīti vadeyyaṃ, taṃ mamassa musā.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실이 아니다.
“yaṃ, bhikkhave ... pe ... tamahaṃ jānāmi ca na ca jānāmīti vadeyyaṃ, taṃpassa tādisameva.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알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yaṃ, bhikkhave ... pe ... tamahaṃ neva jānāmi na na jānāmīti vadeyyaṃ, taṃ mamassa kali.
비구들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 가운데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을 ‘나는 알지도 않고 알지 못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패배다.
“iti kho, bhikkhave, tathāgato daṭṭhā daṭṭhabbaṃ, diṭṭhaṃ na maññati, adiṭṭhaṃ na maññati, daṭṭhabbaṃ na maññati, daṭṭhāraṃ na maññati; sutvā sotabbaṃ, sutaṃ na maññati, asutaṃ na maññati, sotabbaṃ na maññati, sotāraṃ na maññati; mutvā motabbaṃ, mutaṃ na maññati, amutaṃ na maññati, motabbaṃ na maññati, motāraṃ na maññati; viññatvā viññātabbaṃ, viññātaṃ na maññati, aviññātaṃ na maññati, viññātabbaṃ na maññati, viññātāraṃ na maññati. iti kho, bhikkhave, tathāgato diṭṭhasutamutaviññātabbesu dhammesu tādīyeva tādī(*). tamhā ca pana tādimhā añño tādī uttaritaro vā paṇītataro vā natthīti vadāmī”ti.
이렇게 비구들이여, 여래는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들어야 하는 것을 듣고서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닿아 알아야 하는 것을 닿아 알고서 닿아 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닿아 알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닿아 알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닿아 아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인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식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여래는 보고 듣고 닿아 알고 인식해야 하는 법들에서 오직 이러하고 이러하다[여여(如如)]. 그리고 이런 이러함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이러함은 없다고 나는 말한다.”
2. (SN 24-견해 상윳따) 제1품의 경들 ☞ http://nikaya.kr/bbs/board.php?bo_table=happy02_11&wr_id=32
18가지 견해가 생기는 이유와 생기지 않는 방법을 설명한 뒤 예류자(預流者)를 정의합니다.
• 18가지 견해가 생기는 이유 ― 색(色)이 있을 때 색(色)을 집착하고 색(色)을 고집하여 이런 견해가 생김 … 수(受)-상(想)-행(行)-식(識)에 반복,
• 생기지 않는 방법 ― 무상(無常)-고(苦)-변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음
(*) 무상(無常)-고(苦)-변하는 것 = ①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과 ②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 ― ①지난 삶의 누적으로 형성된 오온(五蘊)과 ②오취온(五取蘊)의 활성화 과정 즉 내입처(內入處)-외입처(外入處)로 배분된 지금 삶의 과정으로 해석함.
• 이런 경우들과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불확실함을 버릴 때 → 「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깨달음을 겨냥한 예류자(預流者)」
3. 여섯 가지 견해의 토대 ― (MN 22-뱀의 비유 경)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5_03_02&wr_id=10
1) 배우지 못한 범부 ― ①색(色)-②수(受)-③상(想)-④행(行)들-⑤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⑥‘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我)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常)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의 토대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我)다.’라고 관찰함.
2)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 ①색(色)-②수(受)-③상(想)-④행(行)들-⑤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⑥‘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我)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常)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의 토대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我)가 아니다.’라고 관찰함. →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하지 않음
3) 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나의 것]에 대해 동요-밖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 않음-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나의 아(我)]에 대해 동요-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요 않음에 대한 설명
4) 상(常)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면 소유물을 붙잡아도 좋지만, 비구들도 부처님도 그런 소유물을 보지 못했음.
5) 집착하는 자에게 슬픔-비탄-고통-고뇌-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어취(我語取)에 집착해도 좋지만, 비구들도 부처님도 그런 아어취(我語取)를 보지 못했음.
6) 기대는 자에게 슬픔-비탄-고통-고뇌-절망을 생기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견해에 기대도 좋지만, 비구들도 부처님도 그런 견해에 기대는 것을 보지 못했음.
7) 아(我)와 아(我)에 속한 것의 서로 조건 됨 ― 「아(我)가 있을 때 나의 아(我)에 속한 것이 있다. ↔ 아(我)에 속한 것이 있을 때 나의 아(我)가 있다.」
⇒ 아(我)도 아(我)에 속한 것도 사실로부터 믿을 만함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을 때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아(我)다. 그런 나는 죽은 뒤에 상(常)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의 토대는 전적으로 완전히 어리석은 법
4.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삼매 ― 열반의 상(想) 또는 선(禪) 또는 작의(作意)
1) 열반의 상(想)을 가짐 ― (AN 11.7-상(想) 경)/(AN 11.18-삼매 경1)/(AN 11.19-삼매 경2)/(AN 11.20-삼매 경3)/(AN 11.21-삼매 경4)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9_10_02
“idhānanda, bhikkhu evaṃsaññī hoti — ‘etaṃ santaṃ etaṃ paṇītaṃ, yadidaṃ sabbasaṅkhārasamatho sabbūpadhipaṭinissaggo taṇhākkhayo virāgo nirodho nibbānan’ti. evaṃ kho, ānanda, siyā bhikkhuno tathārūpo samādhipaṭilābho yathā neva pathaviyaṃ pathavisaññī assa, na āpasmiṃ āposaññī assa, na tejasmiṃ tejosaññī assa, na vāyasmiṃ vāyosaññī assa, na ākāsānañcāyatane ākāsānañcāyatanasaññī assa, na viññāṇañcāyatane viññāṇañcāyatanasaññī assa, na ākiñcaññāyatane ākiñcaññāyatanasaññī assa, na nevasaññānāsaññāyatane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saññī assa, na idhaloke idhalokasaññī assa, na paraloke paralokasaññī assa, yampidaṃ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trāpi na saññī assa, saññī ca pana assā”ti.
“여기, 아난다여, 비구는 이런 상(想)을 가졌다. —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行)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愛)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아난다여, 비구는 땅에 대해 땅의 상(想)이 없고, 물에 대해 물의 상(想)이 없고, 불에 대해 불의 상(想)이 없고, 바람에 대해 바람의 상(想)이 없고, 공무변처에 대해 공무변처의 상(想)이 없고, 식무변처에 대해 식무변처의 상(想)이 없고, 무소유처에 대해 무소유처의 상(想)이 없고,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비상비비상처의 상(想)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의 상(想)이 없고, 저세상에 대해 저세상의 상(想)이 없고,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 거기에 대한 상(想)도 없지만, 상(想)이 있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2) 열반을 작의(作意)함 ― (AN 11.8-작의 경)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9_10_01&wr_id=8
“idhānanda, bhikkhu evaṃ manasi karoti — ‘etaṃ santaṃ etaṃ paṇītaṃ, yadidaṃ sabbasaṅkhārasamatho sabbūpadhipaṭinissaggo taṇhākkhayo virāgo nirodho nibbānan’ti. evaṃ kho, ānanda, siyā bhikkhuno tathārūpo samādhipaṭilābho yathā na cakkhuṃ manasi kareyya, na rūpaṃ manasi kareyya ... pe ... yampidaṃ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mpi na manasi kareyya; manasi ca pana kareyyā”ti. aṭṭhamaṃ.
“여기, 아난다여, 비구는 이렇게 작의한다. —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行)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愛)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아난다여, 비구는 안(眼)을 작의(作意)하지 않고, 색(色)을 작의하지 않고, 이(耳)를 작의하지 않고, 성(聲)을 작의하지 않고, 비(鼻)를 작의하지 않고, 향(香)을 작의하지 않고, 설(舌)을 작의하지 않고, 미(味)를 작의하지 않고, 신(身)을 작의하지 않고, 촉(觸)을 작의하지 않고, 땅을 작의하지 않고, 물을 작의하지 않고, 불을 작의하지 않고, 바람을 작의하지 않고, 공무변처를 작의하지 않고, 식무변처를 작의하지 무소유처를 작의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를 작의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작의하지 않고, 저세상을 작의하지 않고,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을 작의하지 않지만, 작의하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3) 열반을 의지한 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선(禪) ― (AN 11.9-삳다 경)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9_10_01&wr_id=6
“idha, saddha, bhadrassa purisājānīyassa pathaviyaṃ pathavisaññā vibhūtā hoti, āpasmiṃ āposaññā vibhūtā hoti, tejasmiṃ tejosaññā vibhūtā hoti, vāyasmiṃ vāyosaññā vibhūtā hoti, ākāsānañcāyatane ākāsānañcāyatanasaññā vibhūtā hoti, viññāṇañcāyatane viññāṇañcāyatanasaññā vibhūtā hoti, ākiñcaññāyatane ākiñcaññāyatanasaññā vibhūtā hoti, nevasaññānāsaññāyatane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saññā vibhūtā hoti, idhaloke idhalokasaññā vibhūtā hoti, paraloke paralokasaññā vibhūtā hoti, yampidaṃ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trāpi saññā vibhūtā hoti. evaṃ jhāyī kho, saddha, bhadro purisājānīyo neva pathaviṃ nissāya jhāyati ... pe ... yampidaṃ diṭṭhaṃ sutaṃ mutaṃ viññātaṃ pattaṃ pariyesitaṃ anuvicaritaṃ manasā, tampi nissāya na jhāyati; jhāyati ca pana. evaṃ jhāyiñca pana, saddha, bhadraṃ purisājānīyaṃ saindā devā sabrahmakā sapajāpatikā ārakāva namassanti —
“여기, 삳다여, 당당한 좋은 성품의 사람은 땅에서 땅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물에서 물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불에서 불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바람에서 바람이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공무변처에서 공무변처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식무변처에서 식무변처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무소유처에서 무소유처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비상비비상처에서 비상비비상처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저세상에서 저세상의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에 대한 상(想)을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선을 하는 당당한 좋은 성품의 사람은, 삳다여, 땅을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물을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불을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바람을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공무변처를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식무변처를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무소유처를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처를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고, 저 세상을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는다. 본 것-들은 것-닿아 안 것-인식한 것-얻은 것-조사한 것-의(意)로 접근한 것을 의지해서도 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을 한다. 삳다여, 이렇게 선을 하는 당당한 좋은 성품의 사람에게 제석천과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고, 빠자빠띠와 함께하는 신들이 멀리서 귀의한다.
“namo te purisājañña, namo te purisuttama.
yassa te nābhijānāma, yampi nissāya jhāyasī”ti.
‘놀라운 분이여,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최상의 분이여,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그대는 어떤 것을 의지하여 선(禪)을 닦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답게 알지 못합니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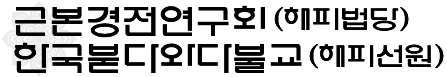

 서적출판
서적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