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의 확장 ― 「vibhava-존재에서 벗어남」
▣ 주제의 확장 ― 「vibhava-존재에서 벗어남」
vibhava의 전통적 해석은 존재 없음/존재하지 않음/단멸(斷滅)입니다.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은 존재에서 벗어남입니다. 단멸이라는 전통적 해석 위에서 왜 단멸이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남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vibhava에 대해 단멸이라는 해석이 왜 옳지 않고, 존재에서 벗어남이라는 해석이 왜 옳은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해석의 타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1. 근본경전연구회는 존재에서 벗어남(vi-bhava)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vibhava ― vi-bhava
vi ― inseparable prefix of separation and expansion, in original meaning of “asunder”
bhava: the state of existence. (m.)
바른 깨달음에 의한 벗어남을 알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지따 께사깜발린이 말하듯 사대(四大)로서 사람을 정의(*)하여 윤회 없음[단견(斷見)-단멸론(斷滅論)]에 의해 죽음을 통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지만,
(*) cātumahābhūtiko ayaṃ puriso 사대(四大), 이것이 사람이다!
바른 깨달음에 의하면, 염오-이탐-소멸의 과정에 의한 해탈지견(解脫知見)을 통해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존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이며, 불사(不死)의 실현에 의한 윤회에서 벗어남입니다.
(*) 세 가지 삶의 방식 ― 「소유의 삶 → (삼매의 성취에 의한) 존재의 삶 → (벗어남에 의한) 해탈된 삶」
이렇게 vibhava는 단순히 단견(斷見)으로의 무(無)를 지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존재에서 벗어남인데, ①[거짓]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으로의 단견(斷見)과 ②[사실] 바른 깨달음에 의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써 존재라는 제한된 삶에서 벗어남의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DN 1-범망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ucchedaṃ vināsaṃ vibhavaṃ’은 ‘단멸과 파괴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대등한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vibhava에 대한 이런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불교 즉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지향점이 바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존재[bhava-유(有)]에서 벗어나 불사(不死)-열반(涅槃)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윤회에서 벗어남으로의 삶의 완성인 것입니다.
2. (KN 2.20-법구경, 길 품) 282 게송은
yogā ve jāyatī bhūri, ayogā bhūrisaṅkhayo.
etaṃ dvedhāpathaṃ ñatvā, bhavāya vibhavāya ca.
tathāttānaṃ niveseyya, yathā bhūri pavaḍḍhati.
참으로 수행에서 지혜가 생기고, 수행하지 않을 때 지혜가 소진된다.
이렇게 존재와 존재에서 벗어남을 위한 두 엇갈린 길을 안 뒤에
지혜가 늘어나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합니다.
; 수행하지 않음 → 지혜의 소진 → 존재의 길 ― 유(有-bhava-존재)
; 수행 → 지혜가 생김 →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 ― 존재에서 벗어남(vibhava)=해탈된 삶
※ vibhava = vi-bhava = 존재에서 벗어남 ↔ vitakka = vi-takka = takka에서 떠남
3. bhava(존재)와 vibhava(존재에서 벗어남) & 있음이라는 견해(atthitā-상견)와 없음이라는 견해(natthitā-단견)의 구별
• vibhava(존재에서 벗어남)의 두 가지 관점
① 아(我)-단멸(斷滅)의 견해에서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른 존재에서 벗어남 ― 거짓
② 무아(無我)-연기(緣起)의 견해에서 누진(漏盡)에 의해 존재에서 벗어남 ― 참/사실
• 있음이라는 견해(atthitā-상견)와 없음이라는 견해(natthitā-단견) ― (SN 12.15-깟짜나곳따 경)
“dvayanissito khvāyaṃ, kaccāna, loko yebhuyyena — atthitañceva natthitañca. lokasamuday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 kaccāna, 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atthitā sā na hoti.
“깟짜나여, 세상은 대부분 ‘있음’과 ‘없음’이라는 쌍(雙)에 의지한다. 그러나 깟짜나여,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깟짜나여,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sabbaṃ atthī’ti kho, kaccāna, ayameko anto. ‘sabbaṃ natthī’ti ayaṃ dutiyo anto. ete te, kaccāna, ubho ante anupagamma majjhena tathāgato dhammaṃ deseti
깟짜나여,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깟짜나여,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여래는 그대에게 중(中)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때, 중(中)에 의해 설해진 법으로는 연기(緣起)의 고집(苦集)과 연멸(緣滅)의 고멸(苦滅)이 제시됩니다.
연기(緣起)에서 유(有-bhava-존재)는 무명(無明)에 조건 지어진 존재 즉 나를 의미합니다(무명 → 행들 → … → 취 → 유 → 생 → 노사).
전도되지 않은 삶은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상(想)-심(心)-견해 위에서 전개되는 해탈된 삶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존재 상태는 상(常)-락(樂)-아(我)의 전도된 상(想)-심(心)-견해 위에서 전개되는 사실에 어긋난 삶입니다.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인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무더기 즉 오온(五蘊)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아(我)다.’라고 집착하면 오취온(五取蘊)이라고 불리는 존재[유(有)]가 됩니다. 이렇게 존재가 되는 현상을 자기화(māna)라고 하는데,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ahaṅkāramamaṅkāramāna)’이고,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성향들(ahaṅkāramamaṅkāramānānusaya)이 없는 심해탈(心解脫)과 혜해탈(慧解脫)의 성취로서 자기화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존재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때, 이렇게 자기화되어 오온(五蘊)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아(我)다.’라고 집착한 상태를 연기는 유(有-bhava-존재)라고 부르고, 자기화의 잠재성향을 뿌리 뽑아 자기화가 해소된 상태를 유멸(有滅-bhavaniridha-존재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有)로부터 유멸(有滅)을 실현하는 현상을 ‘존재에서 벗어남(vibhava)’이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vibhava는 존재 없음/존재하지 않음/단멸(斷滅)을 의미합니다.
• 빠알리 사전 : non -- existence cessation of life, annihilation
• 번역의 예
|
경 |
원전(빠알리) |
초기불전연구원 |
한국빠일리성전협회 |
bhikkhu bodhi |
|
(DN 1.15-범망경, 단멸을 말하는 자) |
sato sattassa ucchedaṃ vināsaṃ vibhavaṃ |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 |
현존하는 뭇삶은 단멸하고 파멸하고 멸망한다 |
the annihilation, destruction, and extermination of an existent being |
|
(SN 56.11-전법륜경) |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 |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 |
craving for sensual pleasures, craving for existence, craving for extermination |
그런데 앞의 그림에서 나타내었듯이 vibhava는 두 가지 경우의 존재에서 벗어남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없음(natthitā)의 견해에 의해 몸이 무너진 뒤 존재하지 않게 됨에 의해 존재에서 벗어남의 경우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단견(斷見)/단멸론(斷滅論)이라는 삶에 대한 세상의 어긋난 견해일 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무아(無我)인 존재가 번뇌의 영향으로 연기(緣起)된 존재가 되었지만, 번뇌의 부서짐[누진(漏盡)]에 의해 연기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경우인데, 깨달음에 의한 사실에 들어맞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전통적 해석에서는 vibhava를 삿된 견해의 관점에서만 이해하여 단멸로 이해하였다고 할 텐데, 불교 즉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에서는 연기된 존재에서 벗어남 즉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1. ucchedaṃ vināsaṃ vibhavaṃ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1) (DN 1-범망경)은 단멸을 말하는 자(ucchedavādo)를 7가지 기반에 의해 존재하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는 7부류의 사문-바라문으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경험된 것이고, 애(愛)에 속한 것들이고, 동요이고, 몸부림일 뿐입니다. 이런 선언은 촉(觸)을 조건으로 하고, 촉(觸)과 다른 곳에서 경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MN 102-다섯이면서 셋 경)은 존재하고 있는 중생의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는 그 사문-바라문들이 죽은 뒤의 아(我)를 선언하는 사문-바라문들을 죽음 이후에 대한 집착을 이유로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 부처님은 그들이 유신(有身)에 대한 두려움과 유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유신의 주위를 달리고, 맴돈다고 설명합니다.
3) (MN 22-뱀의 비유 경)은 해탈한 심(心)을 가진 비구에게서 ‘여래의 식(識)이 의지한 이것’이라고 발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여래는 ‘지금여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부처님을 ‘사문 고따마는 허무주의자다. 존재하고 있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한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비방합니다. 부처님은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직접 말하는데, 불교가 윤회를 부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직접 타파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윤회하는 삶에서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苦)와 고멸(苦滅)을 꿰뚫어 알게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2. 두 가지 견해 ― bhavadiṭṭhi ca vibhavadiṭṭhi ca. 존재의 견해와 존재에서 벗어남의 견해(DN 33.5-합송경, 두 가지로 구성된 법들)
존재의 견해는 상(常)-락(樂)-아(我)-정(淨)의 전도된 상(想)-심(心)-견해여서 상견(常見)을 기본으로 하지만, (DN 1-범망경)은 존재하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선언하는 단멸론(斷滅論)에서도 일곱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아(我)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1) 아(我)이면서 상(常-bhava)인 것과 단(斷-vibhava)인 것으로 두 가지 견해를 구분할 것인지,
2) 상(常)-단(斷)의 아(我)인 유(有-bhava)와 아(我)라는 전도된 견해에서의 벗어남(vibhava) 즉 무아(無我)의 전도되지 않음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구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MN 60-흠 없음 경)은 흠 없는 법(apaṇṇako dhammo)을 소개하는데, 「저세상-결실-오염과 청정의 원인과 조건-무색계의 존재-존재의 소멸은 있다는 견해 위에서 무익한 경우를 배제하고, 금생과 내생의 양쪽 부분을 채우고 서 있는 삶」입니다. 이때, 무색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색(色)들의 염오-이탐-소멸을 위해 실천하고, 존재의 소멸(bhavanirodho)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존재들의 염오-이탐-소멸을 위해 실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vibhava는 bhava에서 bhavanirodha를 향한 실천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존재에서의 벗어남’입니다.
3. vibhavataṇhā =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愛)
(SN 56.11-전법륜(轉法輪) 경)은
idaṃ kho pana, bhikkhave, dukkhasamudayaṃ ariyasaccaṃ — yāyaṃ taṇhā ponobbhavikā nandirāgasahagatā tatratatrābhinandinī, seyyathidaṃ — kāmataṇhā, bhavataṇhā, vibhavataṇhā
비구들이여,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貪)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愛)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고집성제(苦集聖諦)]인데, 소유의 애(愛), 존재의 애(愛),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愛)[욕애(慾愛)-유애(有愛)-무유애(無有愛)]가 있다.」
라고 고집성제(苦集聖諦)인 애(愛)를 정의합니다.
vibhava의 대표적 용례인 vibhavataṇhā는 단멸을 바라는 애(愛)라고 해석되어 무유애(無有愛)로 한역(漢譯) 되었는데, vibhava에 대한 두 가지 시각 가운데 단견(斷見)의 경우만으로 해석하였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3가지 애(愛) 즉 kāmataṇhā[욕애(慾愛)], bhavataṇhā[유애(有愛)], vibhavataṇhā[무유애(無有愛)]의 구성은 소유-존재(有)-단멸(無)의 애(愛)가 아니라 소유를 넘어선 존재 그리고 존재의 문제까지도 해소하여 존재에서 벗어남을 위한 애(愛)라고 해석해야 타당합니다.
• 소유의 애(愛), 존재의 애(愛),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愛)[욕애(慾愛)-유애(有愛)-무유애(無有愛)] ― 소유의 삶-존재의 삶 → 해탈된 삶 ☞ http://nikaya.kr/bbs/board.php?bo_table=happy09_02&wr_id=8참조
; 존재의 애(愛) ― 아(我)에 대한 관점은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을 포괄함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4_01_01&wr_id=7참조
※ 아(我)의 관점에서 단멸을 말하는 경우에도 sato sattassa ucchedaṃ vināsaṃ vibhavaṃ(존재하는 중생들의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vibhava(존재에서 벗어남)은 단멸의 관점에서 ‘단멸하므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는 사견(邪見)의 접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애(愛)의 정의에 속하는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愛-vibhavataṇhā)와는 적용된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DN 33-합송경,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애(愛)를 ①욕애(慾愛)-유애(有愛)-무유애(無有愛), ②욕애(慾愛)-색애(色愛)-무색애(無色愛), ③색애(色愛)-무색애(無色愛)-멸애(滅愛)의 세 가지 형태로 정의하는데, ①욕애(慾愛)-유애(有愛)-무유애(無有愛)에 대해
②욕애(慾愛)-색애(色愛)-무색애(無色愛)는 욕애(慾愛)-유애(有愛)를 상세히 펼치고,
③색애(色愛)-무색애(無色愛)-멸애(滅愛)는 유애(有愛)-무유애(無有愛)를 상세히 펼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http://sutta.kr/bbs/board.php?bo_table=nikaya04_03_10&wr_id=30참조
이런 이해에서 vibhavataṇhā(무유애(無有愛))는 멸애(滅愛)인데, 멸(滅)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無明)이 버려지고 명(明)이 생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vibhavataṇhā는 단멸(斷滅)을 갈구하는 현상이 아니라 해탈된 삶을 소망하지만, 아직은 탐(貪)[욕탐(欲貪)-색탐(色貪)-무색탐(無色貪)]의 상태여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애(愛) 즉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愛)라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愛)’에 대한 이해 ― esanāsuttaṃ (SN 45.161-추구 경)
• 세 가지 추구 ― kāmesanā, bhavesanā, brahmacariyesanā[소유의 추구, 존재의 추구, 범행(梵行)의 추구]
• brahmacariyesanā[범행(梵行)의 추구] ― 소유(慾)와 존재(有)를 넘어서 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한 실천의 추구
• 추구와 애(愛)의 대비 ― kāmataṇhā ↔ kāmesanā, bhavataṇhā ↔ bhavesanā, vibhavataṇhā ↔ brahmacariyesanā ⇒ vibhava(존재에서 벗어남) ↔ brahmacariya(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한 실천)
→ 세 가지 추구의 완전한 부서짐(parikkhaya) 또는 버림(pahāna)을 위한 팔정도(八正道)라는 설명에 의하면 범행의 추구도 완전히 부서지고 버려져야 하는데, 범행의 완성을 통한 넘어섬입니다. ⇒ vibhavataṇhā는 단멸(斷滅)에 대한 애(愛)가 아니라 해탈된 삶[존재를 넘어섬/존재에서 벗어남]의 실현을 위한 실천에 대한 애(愛)
• 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한 실천에 대한 애(愛)의 타당성 ― (AN 9.36-선(禪) 경)의 dhammarāga(법에 대한 탐)-dhammanandi(법에 대한 소망)이 nandirāgasahagatā 즉 소망과 탐(貪)이 함께한 것으로의 애(愛)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貪)이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로 나타나는 것은 범행의 실천 과정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해서 takka의 결과가 애(愛)이기 때문이라는 이해입니다.
⇒ 결국, vibhavataṇhā는 brahmacariyesanā의 과정이 완성되지 못한 경지에서의 takka의 결과로 생겨나는 애(愛)여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 속한 것입니다.
※ 이런 이해는 tasināsuttaṃ (SN 45.171-갈증 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kāmatasinā(소유의 갈증), bhavatasinā(존재의 갈증), vibhavatasinā(존재에서 벗어남의 갈증)입니다. taṇhā를 갈애라고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데, vibhavatasinā(존재에서 벗어남의 갈증)은 vibhava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지시한다고 하겠습니다.
vibha의 용례는 답글에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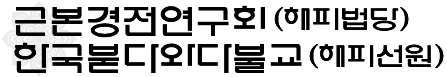
![vibhava의 의미 ‒ bhava[유(有)-존재]에서 벗어남.jpg](http://nikaya.kr/data/editor/2406/20240609200454_3c4ca20be3893af763b3f050bb407ce0_d2re.jpg)

 서적출판
서적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