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불교의 경지는 무엇이 있죠?
[질문] 불교의 경지는 무엇이 있죠? ㅡ 당장에 생각나는 거라곤 무아지경 삼매경이나 무애자재 뿐인데 다른 경지라고 할만한 것이 뭐가 있죠?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903&docId=363544614&page=1#answer5
(DN 11-께왓따 경) 등은 교본(敎本)[이어지는 가르침-가르침의 근본]의 비범(非凡)을 설명하는데,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현재의 부처님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에게로 이어지는 가르침의 특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ㅡ 「그러면 께왓따여, 무엇이 교본의 비범인가? 여기, 께왓따여, 비구는 이렇게 이어서 가르친다. ㅡ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vitakka]. 이렇게 마음을 주목하고 이렇게 마음을 주목하지 말라[작의(作意)].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라고. 이것이, 께왓따여,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또한, 께왓따여, 여기 여래-아라한-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한다. … 이렇게, 께왓따여, 비구는 계(戒)를 갖춘다. … 초선(初禪)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도, 께왓따여,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 제이선(第二禪)… 제삼선(第三禪)… 제사선(第四禪)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도, 께왓따여,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 지(知)와 견(見)으로 심(心)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 이것도, 께왓따여,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 다음에는 현재 상태[유(有)]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 이것도, 께왓따여,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린다.」
이때, 생각의 떠오름(vitakka)은 행위의 출발 자리이고, 마음의 주목[작의(作意)]은 인식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인식의 양면을 잘 제어하여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버리고 도움 되는 것은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취하여 머물러야 하는 것’이 질문하신 불교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ㅡ 「어떤 경지를 성취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
디가 니까야 제1권에 속하는 (DN 2-사문과경)은 사문됨의 결실로서의 수행체계를 설명하는데, 계(戒)의 토대 위에서 사념처(四念處) 수행으로 장애를 버리고 삼매에 들면, 이어지는 삼매수행[삼매를 닦음]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디가 니까야 제1권의 경들은 대부분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를 반복하며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데, 께왓따 경도 이 수행체계로써 성취해서 머물러야 하는 경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삼매를 닦는 수행과정은 사선(四禪)[초선(初禪)-제이선(第二禪)-제삼선(第三禪)-제사선(第四禪)]과 제사선(第四禪) 위에서의 여덟 가지 앎[지(知)와 견(見)-의성신(意成身)-육신통(六神通)]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사선(四禪)은 ‘초선 ~ 제사선을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설명되는데, 질문하신바, 성취하여 머무는 경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가운데 이어지는 여덟 가지 앎은 ①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지(知)와 견(見)에 의해 무색계(無色界)를 성취하여 머물고, ②의성신(意成身)을 만들어 색계(色界)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경지를 성취하여 머물고, ③신족통(神足通)[신통력]을 성취하여 머물고, ④천이통(天耳通)[하늘의 소리를 들음]을 성취하여 머물고, ⑤타심통(他心通)[남의 마음을 앎]을 성취하여 머물고, ⑥숙명통(宿命通)[전생의 기억]을 성취하여 머물고, ⑦천안통(天眼通)[업에 따른 죽고 태어남을 봄]을 성취하여 머물며, 마지막으로 ⑧누진통(漏盡通)[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성취하여 머묾’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수행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불교의 경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깨달아 열반(涅槃)이라는 완성의 경지를 실현하는 이런 과정은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사선을 토대로 직접 번뇌를 부수고[누진통] 해탈하면 혜해탈자(慧解脫者)[아라한]이고, 숙명통-천안통에 이어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면 삼명(三明) 아라한, 신족통-천이통-타심통-숙명통-천안통에 이어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면 육신통 아라한, 지(知)와 견(見) 그리고 의성신의 과정을 통해 무색계(無色界)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물면서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면 양면해탈자(兩面解脫者)라고 불립니다.
※ 이렇게 아라한(阿羅漢)을 성취하는 과정은 멀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예류자(預流者)-일래자(一來者)-불환자(不還者)-아라한(阿羅漢)으로, 또는 예류도(預流道)-예류과(預流果), 일래도(一來道)-일래과(一來果), 불환도(不還道)-불환과(不還果), 아라한도(阿羅漢道)-아라한(阿羅漢)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사쌍팔배(四雙八輩)의 성자(聖者)입니다.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하는 과정으로의 단계적인 경지입니다.
이때, 불교에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혜해탈자(慧解脫者)로 제시됩니다. 깨달음은 결국 번뇌를 부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ㅡ 「사리뿟따여, 이 오백 명의 비구 가운데 육십 명의 비구는 삼명(三明)을 갖춘 자이고, 육십 명의 비구는 육신통(六神通)을 갖춘 자이고, 육십 명의 비구는 양면해탈자(兩面解脫者)이고, 나머지는 혜해탈자(慧解脫者)이다.」(SN 8.7-자자(自恣)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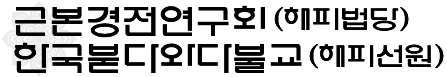

 사회참여/외부특강
사회참여/외부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