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불교의 육근과 오온설로 해석해 봤는데 맞나요? ㅡ 느낌-감정 ㅡ 메커니즘적 이해
[질문] 불교의 육근과 오온설로 해석해 봤는데 맞나요? ㅡ 느낌-감정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903&docId=363726933&page=1#answer3
느낌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SN 48.36-분석 경1) 등에 의하면, 즐거움의 기능[락근(樂根)], 괴로움의 기능[고근(苦根)], 만족의 기능[희근(喜根)], 고뇌의 기능[우근(憂根)], 평정의 기능[사근(捨根)]으로의 느낌은 신(身)에 속한 것, 심(心)에 속한 것, 촉(觸)에서 생기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촉(觸)에서 생기는 것은 내입처(內入處)와 외입처(外入處) 간의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느낌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비가 오려고 후덥지근하면서 몸이 끈적해지고 좋지 않은 느낌’이 신(身)과 촉(觸)의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신(身)에 속한 느낌인지의 측면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환경의 영향으로 몸에 느껴지는 신(身)에 속한 느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촉(觸)은 신(身)과 촉(觸)으로의 phoṭṭhabba인지, 신(身)과 촉(觸-phoṭṭhabba) 그리고 신(身)-촉(觸)의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신식(身識)의 삼사화합(三事和合)으로의 phassa인지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역(漢譯)에서 두 개의 다른 단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물론, 니까야에 의하면, 여기서 신(身)은 신처(身處)이지 신근(身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身) 즉 신처(身處)는 신식(身識)[식온(識蘊)]과 신근(身根)이 함께한 인식주관인 나라는 것이 니까야의 해석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은 식(識)의 인식작용에서 설명됩니다. 식(識)은 두 자리에서 인식을 하는데, ②내입처(內入處)와 외입처(外入處)에서 식(識)과 근(根)이 함께한 처(處)의 입장에서 외입처(外入處)를 인식하여 식(識)을 생겨나게 하는 자리[1차 인식]와 ②생겨난 식(識)이 삼사화합[촉(觸)]하여 생겨나는 수(受)를 인식하는 자리[2차 인식]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은 탐(貪)-진(嗔)-치(癡)와 연결되는데, 2차 인식에서 식(識)과 함께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상(想)의 작용입니다. 좋지 않은 느낌[고(苦)]에 대해 상(常)-락(樂)-아(我)의 경향으로 상(想)이 참여하여 무명(無明)과 진(嗔)을 생겨나게 하면서 전개되는 삶의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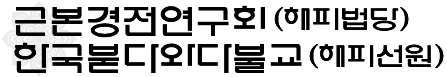

 사회참여/외부특강
사회참여/외부특강